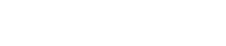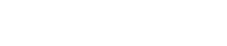스티븐 호킹의 “천국은 없다.”는 발언, 어떻게 볼 것인가? <불광>
페이지 정보
본문
스티븐 호킹의 “천국은 없다.”는 발언, 어떻게 볼 것인가?
<번뇌는 내생을 부른다>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천국이나 내생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든 동화 같은 얘기다.” “뇌란 그 부속품이 망가지면 멈춰버리는 컴퓨터와 다를 게 없다.” 지난 5월15일에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시사전문지 ‘가디언’과 인터뷰하면서 내뱉은 말이다. 아니, ‘내뱉은 말’이라기보다 휠체어에 연결된 ‘음성합성장치’를 통해서 대담자에게 전한 말이다.
1988년 발간했던 <시간의 역사>에서 호킹은 ‘모든 것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는 것은 “인간 이성의 궁극적 승리를 의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때에 신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거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일 수 있다.”는 등 ‘기독교적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2010년에 저술한 <위대한 설계>에서는 “도화선에 점화하여 우주가 나타나게 하는 데 신을 불러낼 필요가 없다.”거나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무(無)로부터 스스로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쓰고 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태교와 같은 셈족의 종교에서 신봉해 온 ‘창조주’의 존재를, 물리학의 영역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올해 5월 ‘가디언’에 실린 인터뷰에서 호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영혼과 내세의 존재까지 부정한다.
호킹의 발언은 매스컴을 타고서 즉각 전 세계로 퍼졌으며, 서구의 과학자나 종교인들은, 마치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를 비판하거나 옹호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불교나 인도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으면 모든 것은 끝난다.”거나 “천국이나 내생은 없다.”는 호킹의 발언이 전혀 새삼스럽게 들리지 않는다. 지금부터 2,600여 년 전, 부처님 당시의 인도 종교계에도 이와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갠지스 강 주변에서 수행생활을 했던 육사외도(六師外道) 가운데 하나인 유물론자였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는 두 가지 종교전통이 있었는데, 하나는 인더스 강 상류인 펀잡(Punjab) 지방을 중심으로 유포되어 있던 ‘바라문교’였고, 다른 하나는 갠지스 강 주변에 퍼져 있던 ‘사문(沙門)들의 종교’였다. 사문이란 범어 ‘슈라마나(Śramaṇa)’의 음사어로, ‘노력하는 사람’ 또는 ‘고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이란 말이다. 불전에서는 그 당시의 대표적인 사문들을 육사외도라고 부른다. ‘이교도(異敎徒)인 여섯 스승’이라는 의미다. 이 가운데 하나인 짜르와까(Cārvāka)는 철저한 유물론자였다. 짜르와까의 교단은 순세파(順世派)라고도 불린다. 문자 그대로 ‘세속에 순응하는 학파’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스티븐 호킹의 발언과 다를 게 없다. “이 세상에는 지(地), 수(水), 화(火), 풍(風)의 네 가지 [물질적인] 요소만 있을 뿐이다. 이 네 요소로부터 정신이 발생한다.” “천국은 없다. 궁극적 해탈도 없다. 다른 세상으로 가는 영혼도 없다.”
인도종교 전통에서 다른 모든 학파들로부터 ‘천박한 사상’이라고 가장 혹독하게 비판받았던 유물론이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설득력 있는 주류의 사상이 되어 있다. 스티븐 호킹의 주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물학이든, 물리학이든, 의학이든, 뇌과학이든 현대의 과학 이론은 철저한 유물론이다. 현대의 과학자들이 어떤 저의를 갖고서 유물론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치밀하게 탐구하다가 도출된 이론이기에 그들에 대해서 “천박하다.”거나 “냉혹하다.”고 나무랄 수도 없는 일이다. 유물론자들을 ‘순세파’라고 부르는 데서 보듯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대부분 유물론자에 다름 아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지독한 유물론자’인 호킹 박사의 발언 가운데 “우주가 인격신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다.”는 통찰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내생이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든 동화 같은 얘기’라거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생각은 위험한 ‘단견(斷見)’일 뿐이다. 불전에 의하면 ‘자아(Ātman)와 세간(Loka)의 한계’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한다. “자아와 세간에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은 “내가 내생에 태어나는지, 아닌지?”에 대한 물음이기에, 앞에서 설명한 ‘가디언’지의 대담자가 스티븐 호킹에게 던진 질문과 다르지 않다. 호킹은 “없다.”고 대답하지만, 부처님은 ‘침묵’하셨다. 호킹의 대답은 단견(斷見)이지만, 부처님은 중도(中道)를 지키셨다. 부처님의 침묵을 무기설(無記說)이라고 부른다. ‘침묵의 설법’이란 뜻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경문을 보면 부처님의 대응이 침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침묵 이후에 반드시 연기(緣起)의 설법이 이어진다. ‘모든 생명체의 생존 방식인 십이연기(十二緣起)의 가르침’이나 ‘오온(五蘊)의 무상(無常), 무아(無我) 등 삼법인(三法印)의 가르침’ 또는 ‘고, 집, 멸, 도 사성제(四聖諦)’ 등의 교설이 덧붙여진다. 이 모두 상견(常見)과 단견(斷見)에서 벗어난 중도의 가르침들이다. 침묵 이후에 이런 교설들을 제시함으로써 ‘질문자에게 형이상학적 의문을 일으킨 사고방식’을 시정해 주시는 것이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다. 조금 전의 나의 몸과 마음은 지금의 그것과 같지[一] 않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르지[異]도 않다. 앞의 몸과 마음에 의존하여 지금의 그것이 있기 때문이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불일불이(不一不異)의 중도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내가 그대로 내생으로 이어지지[常]도 않는다. 그렇지만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는[斷] 것도 아니다. 불상부단(不常不斷)의 중도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중도적으로 흘러가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중도적으로 흘러간다. 탐욕, 분노, 우치, 교만 등의 모든 번뇌가 끊어지지 않은 이상 그렇다는 말이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정체는 ‘한 점 의식의 흐름’일 뿐이다. 주관적으로 보면 이는 ‘나의 주의력의 이동’에 대응된다. 나의 뇌 속의 신경세포를 훑고 있는 ‘한 점 의식의 흐름’이, 나의 모든 체험을 구성한다. 마치 ‘브라운관 TV’의 전자총에서 발사되는 ‘한 점 빛의 흐름’인 주사선(走査線)이 ‘평면 영상’의 착각을 만들어 내듯이.
불교적으로 볼 때 호킹이 말하듯이 “내생이 없을 수 있다.” 다만 그가 아라한이 되었다면 그렇다. 탐욕, 분노, 우치, 교만 등의 번뇌를 모두 끊은 성인(聖人), 달리 말해서 세상에 맺힌 한(恨)이 모두 풀린 아라한이 되었을 때에는 그에게 내생은 없다. 아함경이나 니까야를 보면 아라한의 지위에 오른 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경구를 읊는다. “나의 삶은 다 끝났다. 청정한 행은 이미 세웠고, 할 일을 다 마쳤으니, 다음 생을 받지 않을 것을 나 스스로 아노라.” 예불문에서 향을 사루어 올리는 오분법신(五分法身) 가운데 해탈지견(解脫知見)이 바로 이런 자각이다. 해탈했다는 자각이다. 그러나 재물욕이나 명예욕, 성욕이나 식욕, 분노나 ‘종교적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를 모두 끊지 못한 한, 다시 말해 우리에게 세속의 욕락에 대한 한(恨)이 남아 있는 한, 우리의 ‘주의력의 흐름’과 동치인 ‘한 점 의식의 흐름’은 죽는 순간 컴컴해진 답답한 뇌 속에서 튀어나간다. 욕락을 찾아서 …. 다음 생이 다시 시작된다.
<번뇌는 내생을 부른다>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천국이나 내생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든 동화 같은 얘기다.” “뇌란 그 부속품이 망가지면 멈춰버리는 컴퓨터와 다를 게 없다.” 지난 5월15일에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시사전문지 ‘가디언’과 인터뷰하면서 내뱉은 말이다. 아니, ‘내뱉은 말’이라기보다 휠체어에 연결된 ‘음성합성장치’를 통해서 대담자에게 전한 말이다.
1988년 발간했던 <시간의 역사>에서 호킹은 ‘모든 것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는 것은 “인간 이성의 궁극적 승리를 의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때에 신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거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일 수 있다.”는 등 ‘기독교적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2010년에 저술한 <위대한 설계>에서는 “도화선에 점화하여 우주가 나타나게 하는 데 신을 불러낼 필요가 없다.”거나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무(無)로부터 스스로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쓰고 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태교와 같은 셈족의 종교에서 신봉해 온 ‘창조주’의 존재를, 물리학의 영역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올해 5월 ‘가디언’에 실린 인터뷰에서 호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영혼과 내세의 존재까지 부정한다.
호킹의 발언은 매스컴을 타고서 즉각 전 세계로 퍼졌으며, 서구의 과학자나 종교인들은, 마치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를 비판하거나 옹호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불교나 인도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으면 모든 것은 끝난다.”거나 “천국이나 내생은 없다.”는 호킹의 발언이 전혀 새삼스럽게 들리지 않는다. 지금부터 2,600여 년 전, 부처님 당시의 인도 종교계에도 이와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갠지스 강 주변에서 수행생활을 했던 육사외도(六師外道) 가운데 하나인 유물론자였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는 두 가지 종교전통이 있었는데, 하나는 인더스 강 상류인 펀잡(Punjab) 지방을 중심으로 유포되어 있던 ‘바라문교’였고, 다른 하나는 갠지스 강 주변에 퍼져 있던 ‘사문(沙門)들의 종교’였다. 사문이란 범어 ‘슈라마나(Śramaṇa)’의 음사어로, ‘노력하는 사람’ 또는 ‘고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이란 말이다. 불전에서는 그 당시의 대표적인 사문들을 육사외도라고 부른다. ‘이교도(異敎徒)인 여섯 스승’이라는 의미다. 이 가운데 하나인 짜르와까(Cārvāka)는 철저한 유물론자였다. 짜르와까의 교단은 순세파(順世派)라고도 불린다. 문자 그대로 ‘세속에 순응하는 학파’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스티븐 호킹의 발언과 다를 게 없다. “이 세상에는 지(地), 수(水), 화(火), 풍(風)의 네 가지 [물질적인] 요소만 있을 뿐이다. 이 네 요소로부터 정신이 발생한다.” “천국은 없다. 궁극적 해탈도 없다. 다른 세상으로 가는 영혼도 없다.”
인도종교 전통에서 다른 모든 학파들로부터 ‘천박한 사상’이라고 가장 혹독하게 비판받았던 유물론이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설득력 있는 주류의 사상이 되어 있다. 스티븐 호킹의 주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물학이든, 물리학이든, 의학이든, 뇌과학이든 현대의 과학 이론은 철저한 유물론이다. 현대의 과학자들이 어떤 저의를 갖고서 유물론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치밀하게 탐구하다가 도출된 이론이기에 그들에 대해서 “천박하다.”거나 “냉혹하다.”고 나무랄 수도 없는 일이다. 유물론자들을 ‘순세파’라고 부르는 데서 보듯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대부분 유물론자에 다름 아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지독한 유물론자’인 호킹 박사의 발언 가운데 “우주가 인격신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다.”는 통찰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내생이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든 동화 같은 얘기’라거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생각은 위험한 ‘단견(斷見)’일 뿐이다. 불전에 의하면 ‘자아(Ātman)와 세간(Loka)의 한계’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한다. “자아와 세간에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은 “내가 내생에 태어나는지, 아닌지?”에 대한 물음이기에, 앞에서 설명한 ‘가디언’지의 대담자가 스티븐 호킹에게 던진 질문과 다르지 않다. 호킹은 “없다.”고 대답하지만, 부처님은 ‘침묵’하셨다. 호킹의 대답은 단견(斷見)이지만, 부처님은 중도(中道)를 지키셨다. 부처님의 침묵을 무기설(無記說)이라고 부른다. ‘침묵의 설법’이란 뜻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경문을 보면 부처님의 대응이 침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침묵 이후에 반드시 연기(緣起)의 설법이 이어진다. ‘모든 생명체의 생존 방식인 십이연기(十二緣起)의 가르침’이나 ‘오온(五蘊)의 무상(無常), 무아(無我) 등 삼법인(三法印)의 가르침’ 또는 ‘고, 집, 멸, 도 사성제(四聖諦)’ 등의 교설이 덧붙여진다. 이 모두 상견(常見)과 단견(斷見)에서 벗어난 중도의 가르침들이다. 침묵 이후에 이런 교설들을 제시함으로써 ‘질문자에게 형이상학적 의문을 일으킨 사고방식’을 시정해 주시는 것이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다. 조금 전의 나의 몸과 마음은 지금의 그것과 같지[一] 않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르지[異]도 않다. 앞의 몸과 마음에 의존하여 지금의 그것이 있기 때문이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불일불이(不一不異)의 중도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내가 그대로 내생으로 이어지지[常]도 않는다. 그렇지만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는[斷] 것도 아니다. 불상부단(不常不斷)의 중도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중도적으로 흘러가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중도적으로 흘러간다. 탐욕, 분노, 우치, 교만 등의 모든 번뇌가 끊어지지 않은 이상 그렇다는 말이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정체는 ‘한 점 의식의 흐름’일 뿐이다. 주관적으로 보면 이는 ‘나의 주의력의 이동’에 대응된다. 나의 뇌 속의 신경세포를 훑고 있는 ‘한 점 의식의 흐름’이, 나의 모든 체험을 구성한다. 마치 ‘브라운관 TV’의 전자총에서 발사되는 ‘한 점 빛의 흐름’인 주사선(走査線)이 ‘평면 영상’의 착각을 만들어 내듯이.
불교적으로 볼 때 호킹이 말하듯이 “내생이 없을 수 있다.” 다만 그가 아라한이 되었다면 그렇다. 탐욕, 분노, 우치, 교만 등의 번뇌를 모두 끊은 성인(聖人), 달리 말해서 세상에 맺힌 한(恨)이 모두 풀린 아라한이 되었을 때에는 그에게 내생은 없다. 아함경이나 니까야를 보면 아라한의 지위에 오른 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경구를 읊는다. “나의 삶은 다 끝났다. 청정한 행은 이미 세웠고, 할 일을 다 마쳤으니, 다음 생을 받지 않을 것을 나 스스로 아노라.” 예불문에서 향을 사루어 올리는 오분법신(五分法身) 가운데 해탈지견(解脫知見)이 바로 이런 자각이다. 해탈했다는 자각이다. 그러나 재물욕이나 명예욕, 성욕이나 식욕, 분노나 ‘종교적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를 모두 끊지 못한 한, 다시 말해 우리에게 세속의 욕락에 대한 한(恨)이 남아 있는 한, 우리의 ‘주의력의 흐름’과 동치인 ‘한 점 의식의 흐름’은 죽는 순간 컴컴해진 답답한 뇌 속에서 튀어나간다. 욕락을 찾아서 …. 다음 생이 다시 시작된다.
- 이전글진정한 종교란 무엇인가? 20.02.24
- 다음글문수스님의 질타와 불교인의 과제 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