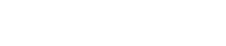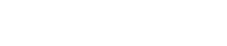진정한 종교란 무엇인가?
페이지 정보
본문
진정한 종교란 무엇인가?
김성철
동국대(경주) 불교학부 교수
얼마 전 TV에서 본 장면이다.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취재하는 이스라엘의 한 작은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자들에 대한 얘기였다. 서너 명의 기자들이, 중무장을 한 이스라엘 병사들이 지키는 초소에 도착하였다. 지척에 있는 곳인데 초병들이 이런 저런 핑계로 시간을 끄는 바람에 기자들은 반나절이 지나서야 겨우 팔레스타인 난민촌에 도착하였다. 항상 그랬다고 했다. 그리곤 그 전날 있었던 이스라엘 공군기의 폭격으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취재를 시작했다. 몇 명이 죽었는지, 누가 죽었는지, 어디를 다쳤는지, 어떤 일을 하다가 다쳤는지, 지금의 심경이 어떤지 ….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울먹이며 그 모든 물음에 대답을 했다. 취재에 무척 협조적이었다. 그 기자들이 자신들의 처절한 고통을 널리 알리기 위해 취재를 하러 오곤 한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기자들은 이스라엘 정부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라고 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라는 구약성경의 가르침에 의한 것인지 몰라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인 거주지에서 폭탄테러가 일어나면, 이스라엘 공군은 즉각 출격을 하여 팔레스타인 난민촌 가운데 ‘적당한’ 곳에 무차별 폭격을 퍼붓는다. 테러와 무관한 수많은 양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불구자가 된다. 되로 받으면 말로 갚고야 만다는 것을 시현(示現)해 줄 경우, 테러가 사라질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그 후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테러는 계속된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의 말과 같이 ‘눈에는 눈!’이라는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들 모두의 눈이 멀 것 같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취재를 하는 이스라엘 기자들은 ‘유태교 신자’들이었고 취재에 응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슬람교 신자’들이었다. 중동을 포함한 서구의 역사에서 유태교와 가톨릭과 이슬람교와 개신교는 서로 반목하며 죽이고 죽는 종교전쟁을 계속해 왔는데, ‘유태교 신자’인 이 이스라엘 기자들은 무엇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교도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일까? 유태교도로 개종을 시키기 위해서일까? 그럴 수도 없지만, 그건 아니었다. TV카메라에 비친 그들에게서는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준엄한 분노’의 모습만 볼 수 있었다. 자신들의 종교 세력을 넓히기 위한 가장된 ‘위선’의 모습이나, 남의 고통을 이용해 우월의 기쁨을 만끽하는 ‘교만’의 모습은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면 ‘유태교도’인 이들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이슬람교도’인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다가가게 만든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내재한 불성(佛性)이었다. 불성이란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인지(認知)로 자각되기도 하고 자타불이의 감성(感性)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는다(一切衆生 悉有佛性)”는 <대반열반경>의 가르침은 ‘제도권 종교’ 간에 그어진 선(線)을 지운다. 유태교도든 이슬람교도든, 자신에게 내재한 불성의 편린이라도 자각한 사람은 남의 고통에 대해 방관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종교심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취재하는 이스라엘의 한 언론사 기자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지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불교를 포함하여 인도나 동아시아의 종교에서는 원래 종교 간에 선을 긋지 않았다. 그러나 ‘양과 같은 가축을 키우는 방식’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같은 ‘셈족의 종교(Semitic Religion)’는 ‘종교성’보다 ‘조직성’이 강하기에 종교와 종교, 종파와 종파 간에 진한 선을 그으며 인류의 역사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많은 죄악을 저질러왔다. ‘이슬람교도’인 팔레스타인 난민을 ‘진심으로’ 돕는 ‘유태교도’인 이스라엘 기자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 그들의 ‘선 긋기 식 종교관’에 변화가 오기를 바란다.
김성철
동국대(경주) 불교학부 교수
얼마 전 TV에서 본 장면이다.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취재하는 이스라엘의 한 작은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자들에 대한 얘기였다. 서너 명의 기자들이, 중무장을 한 이스라엘 병사들이 지키는 초소에 도착하였다. 지척에 있는 곳인데 초병들이 이런 저런 핑계로 시간을 끄는 바람에 기자들은 반나절이 지나서야 겨우 팔레스타인 난민촌에 도착하였다. 항상 그랬다고 했다. 그리곤 그 전날 있었던 이스라엘 공군기의 폭격으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취재를 시작했다. 몇 명이 죽었는지, 누가 죽었는지, 어디를 다쳤는지, 어떤 일을 하다가 다쳤는지, 지금의 심경이 어떤지 ….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울먹이며 그 모든 물음에 대답을 했다. 취재에 무척 협조적이었다. 그 기자들이 자신들의 처절한 고통을 널리 알리기 위해 취재를 하러 오곤 한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기자들은 이스라엘 정부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라고 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라는 구약성경의 가르침에 의한 것인지 몰라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인 거주지에서 폭탄테러가 일어나면, 이스라엘 공군은 즉각 출격을 하여 팔레스타인 난민촌 가운데 ‘적당한’ 곳에 무차별 폭격을 퍼붓는다. 테러와 무관한 수많은 양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불구자가 된다. 되로 받으면 말로 갚고야 만다는 것을 시현(示現)해 줄 경우, 테러가 사라질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그 후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테러는 계속된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의 말과 같이 ‘눈에는 눈!’이라는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들 모두의 눈이 멀 것 같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취재를 하는 이스라엘 기자들은 ‘유태교 신자’들이었고 취재에 응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슬람교 신자’들이었다. 중동을 포함한 서구의 역사에서 유태교와 가톨릭과 이슬람교와 개신교는 서로 반목하며 죽이고 죽는 종교전쟁을 계속해 왔는데, ‘유태교 신자’인 이 이스라엘 기자들은 무엇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교도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일까? 유태교도로 개종을 시키기 위해서일까? 그럴 수도 없지만, 그건 아니었다. TV카메라에 비친 그들에게서는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준엄한 분노’의 모습만 볼 수 있었다. 자신들의 종교 세력을 넓히기 위한 가장된 ‘위선’의 모습이나, 남의 고통을 이용해 우월의 기쁨을 만끽하는 ‘교만’의 모습은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면 ‘유태교도’인 이들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이슬람교도’인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다가가게 만든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내재한 불성(佛性)이었다. 불성이란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인지(認知)로 자각되기도 하고 자타불이의 감성(感性)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는다(一切衆生 悉有佛性)”는 <대반열반경>의 가르침은 ‘제도권 종교’ 간에 그어진 선(線)을 지운다. 유태교도든 이슬람교도든, 자신에게 내재한 불성의 편린이라도 자각한 사람은 남의 고통에 대해 방관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종교심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취재하는 이스라엘의 한 언론사 기자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지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불교를 포함하여 인도나 동아시아의 종교에서는 원래 종교 간에 선을 긋지 않았다. 그러나 ‘양과 같은 가축을 키우는 방식’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같은 ‘셈족의 종교(Semitic Religion)’는 ‘종교성’보다 ‘조직성’이 강하기에 종교와 종교, 종파와 종파 간에 진한 선을 그으며 인류의 역사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많은 죄악을 저질러왔다. ‘이슬람교도’인 팔레스타인 난민을 ‘진심으로’ 돕는 ‘유태교도’인 이스라엘 기자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 그들의 ‘선 긋기 식 종교관’에 변화가 오기를 바란다.
- 이전글무아(불교 교리) 20.02.24
- 다음글스티븐 호킹의 “천국은 없다.”는 발언, 어떻게 볼 것인가? <불광> 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