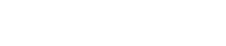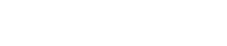空 (불교교리)
페이지 정보
본문
- 공(空) -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김성철
‘색즉시공(色卽是空).’ 수 년 전 상영되었던 ‘19금(禁)’의 영화제목이다. ≪반야심경≫의 경문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렸다는 점에선 긍정적 역할을 했지만, ‘색’의 뜻을 오해하게 만들었다. 색즉시공에서 ‘색’은 영화제목의 암시와 달리 ‘동물적인 매력’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색’은 ‘물질’ 또는 ‘형상’을 의미하며 ‘공’은 “실체가 없다.”는 뜻으로, 색즉시공은 “물질 또는 형상에는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이다.
초기불전에서 부처님은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을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의 다섯으로 분류하셨다. 그 모든 것들이 무상(無常)하며, 괴로운 것이며, 나도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도 아니며, 공(空)하다는 진상을 그대로 알아서 모든 것에 대한 집착에서 떠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 열반을 체득케 하기 위해서였다.
색은 ‘물질이나 형상’, 수는 ‘괴롭거나 즐거운 느낌’, 상은 ‘고정관념과 같은 생각’, 행은 ‘의지와 같은 조작’, 식은 ‘이 모두를 파악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이를 ‘오온(五蘊)’이라고 부른다. 요새 말로 풀면 처음에 거론한 ‘색’은 ‘객관 대상’이고, 마지막의 ‘식’은 ‘주관적 인식’이다. 그리고 ‘수(느낌)’, ‘상(생각)’, ‘행(의지)’은 주관인 ‘식’에서 일어나는 2차적인 심리작용들이다. 이런 다섯 무더기, 즉 오온이 순간순간 변하면서 내가 체험하는 세상만사를 구성한다. 이 가운데 절대 변하지 않으며, 언제나 행복을 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세속적 쾌락’도 그렇지만 ‘신앙의 기도’나 ‘요가 삼매’와 같은 종교 생활을 통해 어떤 체험을 해도 행복은 그때뿐이다. 이 역시 ‘여러 가지 조건이 모여 만들어진 체험’이기에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독특한 종교적 체험’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진정한 행복은 그런 식의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남으로써 얻어진다. 요컨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것에 대한 애착(탐)과 분노(진)와 착각(치)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 오온 가운데 색이든, 수든, 상이든, 행이든, 식이든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알아서 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이런 평화는 ‘짜릿한 기쁨’이나 ‘신비한 감동’과 같은 상대적 행복이 아니다. 이 세상에 맺힌 것이 없기에 ‘죽어도 좋은 편안함’이다. 잔잔한 절대적 행복이다. 열반적정(涅槃寂靜)의 편안함이다. 초기불전의 가르침이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이런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를 아비달마(阿毘達磨)불교라고 부른다. 아비달마란 산스끄리뜨어 아비다르마(abhidharma)를 음사한 말이다. ‘아비(abhi)’는 ‘~에 대한’을 의미하고 ‘다르마(dharma)’는 ‘법(法)’을 뜻하기에, 아비달마를 ‘대법(對法)’이라고 한역하기도 한다. ‘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가르침에 대한 체계적 해석’이 아비달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 아비달마 문헌들이 제작되었다. 그런데 아비달마 문헌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로 인해 대립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의견이 같은 수행자들끼리 별도로 모이면서 부파를 형성하였다. 상좌부, 대중부로 두 개의 부파가 갈렸다가 다시 2차적인 분열이 일어나면서 경량부, 정량부, 독자부, 설일체유부 등 20여 부파가 난립하였다. 그래서 ‘아비달마불교’를 ‘부파불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파불교, 아비달마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의 정체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초기불전에 실린 ‘제행무상(諸行無常)’의 가르침을 “모든 유위법들은 생(生), 주(住), 멸(滅)의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라고 보다 정밀하게 표현하였다. 무아와 윤회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온과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보특가라(pudgala)’라는 윤회의 주체를 고안하기도 하고, 업의 상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자(種子)’의 비유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아비달마 시대, 부파불교 시대가 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점점 번쇄해지기 시작하였다.
제행무상이든, 오온이든, 윤회든, 업이든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마치 ‘강을 건널 때 사용하는 뗏목’과 같은 ‘수단’일 뿐이고 가르침의 취지는 세속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열반적정)를 얻는 것이었는데, 아비달마불교도들은 그 취지는 망각하고 ‘수단’에 집착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뗏목과 같다. 뗏목을 타고서 강을 건너 저편 언덕에 도달했으면 뗏목에서 내려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세속에 대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궁극적으로는 ‘언어화된 가르침’에 대한 고착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비달마불교도들은, 마치 뗏목을 타고서 강의 저 언덕에 도달한 후에도 뗏목에 집착하여 내리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부처님의 언어 그 자체에 집착하면서 그 의미를 분석하고 설명하고 체계를 만드는 데 몰두하였다.
그 때 반야계(般若系) 경전들이 출현하여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아비달마 불교를 질타하였다. ≪반야심경≫에서는 말한다. 공중무색(空中無色), 무수상행식(無受想行識). “공의 경지에는 색도 실재하지 않고 수, 상, 행, 식도 실재하지 않는다!” 무안이비설신의(無眼耳鼻舌身意).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생각도 없다!” …… 무고집멸도(無)苦集滅道. “고, 집, 멸, 도의 사성제도 없다!” 무지역무득(無智亦無得). “지혜도 없고 도달도 없다!” 색수상행식의 오온, 안이비설신의의 육입(六入), 고집멸도의 사성제(四聖諦) 등과 같은 ‘가르침의 뗏목’을 타고 피안의 세계, 공의 세계에 도달했으며, 빨리 뗏목에서 내리라는 재촉인 것이다. 왜냐하면 공의 경지인 피안의 세계, 즉 열반의 언덕에는 ‘언어화 된 가르침’조차 없기 때문이다. 반야계 경전에서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法)조차 공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그러나 그런 공의 경지, 피안의 세계, 열반의 언덕이 저 멀리 어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삼매 속에서 체험하는 심오한 어떤 것도 아니다. 우리가 눈을 훤히 뜨고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공하다. 탄생과 죽음을 되풀이 하는 윤회의 세계가 그대로 열반이다. 차안(此岸) 그대로가 원래 피안이었다. 사바세계의 이 언덕이 그대로 저 언덕이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색불이공(色不異空)’이라는 선언 직후에 ‘공불이색’이라고 말한다. 색과 공이 다르지 않지만 공 역시 색에서 벗어난 별도의 어떤 것이 아니란 가르침이다. 또 ‘색즉시공’이라는 선언에 이어서 ‘공즉시색’이라고 말한다. 색이 그대로 공이지만, 그런 공이 별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색 그 자체란 뜻이다. ‘색즉시공’의 경문이 공을 가르친다면, ‘공즉시색’은 공에 대한 오해를 시정한다.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공하다. 모든 것이 지금 열반에 들어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용수 보살의 ≪중론(中論)≫에서는 “열반은 세간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다.”거나 “열반의 한계와 세간의 한계에는 털끝만큼의 차이도 없다.”고 쓰고 있다. 색이 그대로 공이다. 세간이 그대로 열반에 들어 있다. 공이 그대로 색이다. 열반이 그대로 세간이다.
“큰 방도 원래 없고 작은 방도 원래 없다. 긴 것도 원래 없고 짧은 것도 원래 없다. 예쁘거나 추한 것도 원래 없다.” 이런 모든 ‘형상(色)’들은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머릿속 ‘생각’들이다. 연기(緣起)한 것이다. 외부 세계에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체가 없다. 공하다. 그래서 색즉시공이다.
“눈도 원래 없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중론≫의 설명이다. 아무리 둘러봐도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 내 손도 보이고 코끝도 보이는데 내 눈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눈이 없다는 것이다. 거울에 비친 내 눈은 ‘진정한 눈’이 아니다. ‘눈에 비친 대상’이다. 눈을 ‘안근(眼根)’, 눈에 비친 대상을 ‘색경(色境)’이라고 부른다. ‘거울에 비친 내 눈’은 ‘안근’이 아니라 ‘색경’에 속한다. 남의 얼굴에 달린 눈 역시 ‘색경’일 뿐이다. 손으로 만진 내 눈은 진정한 눈이 아니다. 촉감, 즉 촉경(觸境)에 속하는 감각일 뿐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진정한 눈인 안근, ‘보는 힘을 갖는 눈’을 발견할 수 없다. ‘눈’은 그 명칭만 있었지 실체는 없었다. 실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눈은 공하다. ‘무안이비설신의’라는 ≪반야심경≫의 경문 가운데 ‘무안(無眼)’에 대한 ≪중론≫의 논증이다.
“시간은 실재하지 않는다.”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 없고,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틈에 끼어 있을 곳이 없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 그 실체가 없다.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 원래 아무것도 없다.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이다. 모두 우리의 생각이 만든 것이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다. 공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김성철
‘색즉시공(色卽是空).’ 수 년 전 상영되었던 ‘19금(禁)’의 영화제목이다. ≪반야심경≫의 경문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렸다는 점에선 긍정적 역할을 했지만, ‘색’의 뜻을 오해하게 만들었다. 색즉시공에서 ‘색’은 영화제목의 암시와 달리 ‘동물적인 매력’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색’은 ‘물질’ 또는 ‘형상’을 의미하며 ‘공’은 “실체가 없다.”는 뜻으로, 색즉시공은 “물질 또는 형상에는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이다.
초기불전에서 부처님은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을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의 다섯으로 분류하셨다. 그 모든 것들이 무상(無常)하며, 괴로운 것이며, 나도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도 아니며, 공(空)하다는 진상을 그대로 알아서 모든 것에 대한 집착에서 떠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 열반을 체득케 하기 위해서였다.
색은 ‘물질이나 형상’, 수는 ‘괴롭거나 즐거운 느낌’, 상은 ‘고정관념과 같은 생각’, 행은 ‘의지와 같은 조작’, 식은 ‘이 모두를 파악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이를 ‘오온(五蘊)’이라고 부른다. 요새 말로 풀면 처음에 거론한 ‘색’은 ‘객관 대상’이고, 마지막의 ‘식’은 ‘주관적 인식’이다. 그리고 ‘수(느낌)’, ‘상(생각)’, ‘행(의지)’은 주관인 ‘식’에서 일어나는 2차적인 심리작용들이다. 이런 다섯 무더기, 즉 오온이 순간순간 변하면서 내가 체험하는 세상만사를 구성한다. 이 가운데 절대 변하지 않으며, 언제나 행복을 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세속적 쾌락’도 그렇지만 ‘신앙의 기도’나 ‘요가 삼매’와 같은 종교 생활을 통해 어떤 체험을 해도 행복은 그때뿐이다. 이 역시 ‘여러 가지 조건이 모여 만들어진 체험’이기에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독특한 종교적 체험’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진정한 행복은 그런 식의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남으로써 얻어진다. 요컨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것에 대한 애착(탐)과 분노(진)와 착각(치)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 오온 가운데 색이든, 수든, 상이든, 행이든, 식이든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알아서 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이런 평화는 ‘짜릿한 기쁨’이나 ‘신비한 감동’과 같은 상대적 행복이 아니다. 이 세상에 맺힌 것이 없기에 ‘죽어도 좋은 편안함’이다. 잔잔한 절대적 행복이다. 열반적정(涅槃寂靜)의 편안함이다. 초기불전의 가르침이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이런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를 아비달마(阿毘達磨)불교라고 부른다. 아비달마란 산스끄리뜨어 아비다르마(abhidharma)를 음사한 말이다. ‘아비(abhi)’는 ‘~에 대한’을 의미하고 ‘다르마(dharma)’는 ‘법(法)’을 뜻하기에, 아비달마를 ‘대법(對法)’이라고 한역하기도 한다. ‘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가르침에 대한 체계적 해석’이 아비달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 아비달마 문헌들이 제작되었다. 그런데 아비달마 문헌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로 인해 대립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의견이 같은 수행자들끼리 별도로 모이면서 부파를 형성하였다. 상좌부, 대중부로 두 개의 부파가 갈렸다가 다시 2차적인 분열이 일어나면서 경량부, 정량부, 독자부, 설일체유부 등 20여 부파가 난립하였다. 그래서 ‘아비달마불교’를 ‘부파불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파불교, 아비달마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의 정체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초기불전에 실린 ‘제행무상(諸行無常)’의 가르침을 “모든 유위법들은 생(生), 주(住), 멸(滅)의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라고 보다 정밀하게 표현하였다. 무아와 윤회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온과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보특가라(pudgala)’라는 윤회의 주체를 고안하기도 하고, 업의 상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자(種子)’의 비유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아비달마 시대, 부파불교 시대가 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점점 번쇄해지기 시작하였다.
제행무상이든, 오온이든, 윤회든, 업이든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마치 ‘강을 건널 때 사용하는 뗏목’과 같은 ‘수단’일 뿐이고 가르침의 취지는 세속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열반적정)를 얻는 것이었는데, 아비달마불교도들은 그 취지는 망각하고 ‘수단’에 집착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뗏목과 같다. 뗏목을 타고서 강을 건너 저편 언덕에 도달했으면 뗏목에서 내려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세속에 대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궁극적으로는 ‘언어화된 가르침’에 대한 고착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비달마불교도들은, 마치 뗏목을 타고서 강의 저 언덕에 도달한 후에도 뗏목에 집착하여 내리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부처님의 언어 그 자체에 집착하면서 그 의미를 분석하고 설명하고 체계를 만드는 데 몰두하였다.
그 때 반야계(般若系) 경전들이 출현하여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아비달마 불교를 질타하였다. ≪반야심경≫에서는 말한다. 공중무색(空中無色), 무수상행식(無受想行識). “공의 경지에는 색도 실재하지 않고 수, 상, 행, 식도 실재하지 않는다!” 무안이비설신의(無眼耳鼻舌身意).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생각도 없다!” …… 무고집멸도(無)苦集滅道. “고, 집, 멸, 도의 사성제도 없다!” 무지역무득(無智亦無得). “지혜도 없고 도달도 없다!” 색수상행식의 오온, 안이비설신의의 육입(六入), 고집멸도의 사성제(四聖諦) 등과 같은 ‘가르침의 뗏목’을 타고 피안의 세계, 공의 세계에 도달했으며, 빨리 뗏목에서 내리라는 재촉인 것이다. 왜냐하면 공의 경지인 피안의 세계, 즉 열반의 언덕에는 ‘언어화 된 가르침’조차 없기 때문이다. 반야계 경전에서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法)조차 공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그러나 그런 공의 경지, 피안의 세계, 열반의 언덕이 저 멀리 어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삼매 속에서 체험하는 심오한 어떤 것도 아니다. 우리가 눈을 훤히 뜨고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공하다. 탄생과 죽음을 되풀이 하는 윤회의 세계가 그대로 열반이다. 차안(此岸) 그대로가 원래 피안이었다. 사바세계의 이 언덕이 그대로 저 언덕이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색불이공(色不異空)’이라는 선언 직후에 ‘공불이색’이라고 말한다. 색과 공이 다르지 않지만 공 역시 색에서 벗어난 별도의 어떤 것이 아니란 가르침이다. 또 ‘색즉시공’이라는 선언에 이어서 ‘공즉시색’이라고 말한다. 색이 그대로 공이지만, 그런 공이 별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색 그 자체란 뜻이다. ‘색즉시공’의 경문이 공을 가르친다면, ‘공즉시색’은 공에 대한 오해를 시정한다.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공하다. 모든 것이 지금 열반에 들어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용수 보살의 ≪중론(中論)≫에서는 “열반은 세간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다.”거나 “열반의 한계와 세간의 한계에는 털끝만큼의 차이도 없다.”고 쓰고 있다. 색이 그대로 공이다. 세간이 그대로 열반에 들어 있다. 공이 그대로 색이다. 열반이 그대로 세간이다.
“큰 방도 원래 없고 작은 방도 원래 없다. 긴 것도 원래 없고 짧은 것도 원래 없다. 예쁘거나 추한 것도 원래 없다.” 이런 모든 ‘형상(色)’들은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머릿속 ‘생각’들이다. 연기(緣起)한 것이다. 외부 세계에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체가 없다. 공하다. 그래서 색즉시공이다.
“눈도 원래 없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중론≫의 설명이다. 아무리 둘러봐도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 내 손도 보이고 코끝도 보이는데 내 눈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눈이 없다는 것이다. 거울에 비친 내 눈은 ‘진정한 눈’이 아니다. ‘눈에 비친 대상’이다. 눈을 ‘안근(眼根)’, 눈에 비친 대상을 ‘색경(色境)’이라고 부른다. ‘거울에 비친 내 눈’은 ‘안근’이 아니라 ‘색경’에 속한다. 남의 얼굴에 달린 눈 역시 ‘색경’일 뿐이다. 손으로 만진 내 눈은 진정한 눈이 아니다. 촉감, 즉 촉경(觸境)에 속하는 감각일 뿐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진정한 눈인 안근, ‘보는 힘을 갖는 눈’을 발견할 수 없다. ‘눈’은 그 명칭만 있었지 실체는 없었다. 실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눈은 공하다. ‘무안이비설신의’라는 ≪반야심경≫의 경문 가운데 ‘무안(無眼)’에 대한 ≪중론≫의 논증이다.
“시간은 실재하지 않는다.”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 없고,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틈에 끼어 있을 곳이 없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 그 실체가 없다.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 원래 아무것도 없다.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이다. 모두 우리의 생각이 만든 것이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다. 공이다.
- 이전글십이연기(불교교리) 20.02.24
- 다음글무아(불교 교리) 20.02.24